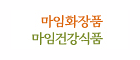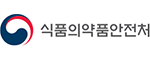산업소개
해외시장뉴스
대(對)오스트리아 수출 1위는 전기차, 반도체 부품·화장품도 유망 품목
첨부파일
등록일 2024-06-14
조회수 398
-
대(對)오스트리아 수출 1위는 전기차, 반도체 부품·화장품도 유망 품목
- 경제·무역
- 오스트리아
- 빈무역관 김현정
- 2024-06-11
- 출처 : KOTRA
-
Keyword#오스트리아 #수출 #수출유망 #반도체 #반도체제조 #반도체장비 #산업용전자제품 #화장품
전기차 전년대비 85.5% 성장해 대(對)오스트리아 최대 수출품
한-EU 반도체 연구협력 강화로 반도체 부품 수출 유망
노후화 노선 재개발·신규 노선 건설… 교통신호기 수요 상승 예상
기술력·시장성 인정받은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는 지속 성장중
2023년 한국의 대오스트리아 수출 실적
지난해 한국의 대오스트리아 수출 상위 5위 품목 자리에는 전기자동차, 무선전화기, 전산기록매체, 집적회로반도체, 승용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총수출 규모는 약 10억2000만 달러로, 2022년 대비 27.7% 하락했다. 이들 상위 5대 품목 중 전기자동차, 승용차를 제외한 3가지 품목이 크게 역성장한 결과로 해석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22년 신제품 효과로 수출액 1위를 달성했던 무선전화기가 기저효과로 인해 –70.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2위로 밀려났다.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전산기록매체(–25.2%), 집적회로반도체(-28.3%) 등도 역시 수출액이 감소했다. 반면, 주요 수출 제품군인 자동차는 2023년 오스트리아에서 신차 등록 기준 3.7%의 점유율을 기록, 전년 대비 0.6% 성장하며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전기자동차는 85.5% 성장하며 대오스트리아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승용차와 기타자동차는 각각 전년 대비 12.4%, 54.3% 성장했다.
이외에 2021년과 2022년 하락세를 보였던 인쇄회로가 다시 소폭 성장했으며(8.7%), 지난해 수출 실적 5위를 기록했던 의료용 전자기기(8위)가 –22.4% 역성장하며 7위 자리를 차지했다.
<2023년 한국의 대오스트리아 10대 수출 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
2021
2022
202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300,632
22.0
1,421,087
9.3
1,027,243
-27.7
1
전기자동차
111,260
8.7
86,329
-22.4
160,170
85.5
2
무선전화기
180,621
470.7
506,391
180.4
148,278
-70.7
3
전산기록매체
231,773
11.6
169,139
-27.0
126,579
-25.2
4
집적회로반도체
194,314
12.6
150,624
-22.5
107,950
-28.3
5
승용차
70,636
11.3
52,051
-26.3
58,486
12.4
6
자동차부품
92,849
26.7
47,188
-49.2
51,748
9.7
7
의료용전자기기
51,688
20.0
59,199
14.5
45,966
-22.4
8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9,390
241.7
14,474
54.2
27,124
87.4
9
기타자동차
97
19.0
13,549
13,842.6
20,911
54.3
10
인쇄회로
17,778
-25.2
17,377
-2.3
18,895
8.7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 호조 품목
지난 한 해 수출 호조를 보여 향후 오스트리아로의 수출이 유망한 품목 리스트를 도출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수출 실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선정된 품목은 총 11개였다.
수출 호조 품목 기준: i) 2023년 기준, 수출증감률 상위 100위 이내, ii) 수출금액 100만 달러 이상, iii) ‘22년 수출증감률 10%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제조 품목
<한국의 대오스트리아 수출 호조 품목 (2023년 기준)>
(단위: US$ 천, %)
증감
순위
금액
순위
코드
품목
2021
2022
202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300,632
22.0
1,421,087
9.3
1,027,243
-27.7
36
26
8113
유선전송장치
64
-96.0
1,182
1,755.2
4,133
249.8
41
28
8324
전자관부품
-
-
1,405
-
4,013
185.7
54
8
732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9,390
241.7
14,474
54.2
27,124
87.4
55
22
8141
교통신호기
2,233
-17.2
2,576
15.4
4,817
87.0
64
74
2273
화장품
565
17.1
676
19.8
1,120
65.5
65
48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304
-55.8
1,200
295.1
1,975
64.6
76
29
6142
철강선
954
-30.9
2,263
137.2
3,360
48.5
78
18
8423
전원장치
2,819
125.6
4,376
55.3
6,390
46.0
79
68
7251
건설중장비
752
-29.5
859
14.2
1,238
44.1
92
50
7121
운반하역기계
987
-22.4
1,449
46.8
1,864
28.7
100
42
8149
기타전자응용기기
1,089
-7.2
1,809
66.1
2,170
19.9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 4단위, 증감률 및 금액 순위는 ‘23년 기준
수출 호조 품목으로 선정된 11개 품목 중 전체 수출 금액 기준으로 상위 10위 안에 든 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품(8위, 2712만 달러/전년 대비 87.4% 증가)이다. 20위권 내에서는 전원장치(18위, 639만 달러/전년 대비 46% 증가) 품목이 추가됐다. 이들 품목은 2022년에도 전년 대비 50%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으며(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54.2%, 전원장치 55.3%), 2021년에도 역시 각각 241.7%, 125.6%를 기록한 바 있어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 코드) 2단위를 기준으로 총 11개의 수출 호조 품목을 제품군별로 구분했다.
<2023년 대오 수출 호조 품목: MTI 2단위 분류>
(단위: US$ 천, %)
MTI 코드
품목
품목 수
22 정밀화학제품
화장품
1
61 철강제품
철강선
1
71 기초산업기계
운반하역기계
1
72 산업기계
건설중장비
1
73 정밀기계
반도체제조용장비,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2
81 산업용전자제품
유선전송장치, 교통신호기, 기타전자응용기기
3
83 전자부품
전자관부품
1
84 전기기기
전원장치
1
총계
11
[자료: 한국무역협회]
가장 많은 품목이 포함된 품목군은 '81 산업용전자제품'으로, 여기에는 유선전송장치(수출 금액 26위, 413만 달러/전년 대비 249.8% 증가), 교통신호기(22위, 482만 달러/ 87% 증가), 기타전자응용기기(42위, 217만 달러/ 19.9%)가 포함된다.
유망품목 관련 산업 동향
아래에서는 위 11개 품목이 포함된 수출 호조 품목 리스트 상 상위 5위에 랭크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살펴봤다. 각 품목의 간략한 수출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11개 호조 품목 중 최고 수출 금액 기록(전체 품목 기준 수출 금액 8위, 2712만 달러/ 전년 대비 87.4% 증가)
⦁ 교통신호기, 유선전송장치, 전자관부품: 해당 품목 모두 전체 품목 기준 수출 금액 30위 이내 기록. 교통신호기(22위, 482만 달러/ 87% 증가), 유선전송장치(26위, 413만 달러/ 249.8% 증가), 전자관부품(28위, 401만 달러/ 185.7% 증가),
⦁ 화장품: 첫 백만 달러 수출 기록 달성(74위, 112만 달러/ 65.5% 증가)
1)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2022년, 대오스트리아 수출에서 1447만 달러로 전체 품목 기준 수출 금액 12위를 기록했던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은 2023년, 2712만 달러를 기록하며 8위로 올라섰다. 반도체제조용장비 역시 64.6%의 수출증감률을 기록하며 198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정부 차원의 관련 산업 지원 의지가 높은 오스트리아의 반도체 산업 전망은 밝아 보인다.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는 IPCEI on Microelectronics 프로젝트*에 참여해 1억5000만 유로의 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한편, 2024년부터 2031년까지 28억 유로를 추가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70억 유로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EU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오스트리아 연구진흥원(FFG)에서는 이전 국가지원 R&D 프로젝트 Lab2Fab에서 확장된 'Microelectronics 2 Market'을 집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프로젝트당 100만 유로를 지원받았으나, 2023년 8월 22일부터 프로젝트당 300만 유로로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주*: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EU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유럽 공동 이익을 위한 중요 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의 투자 상황도 우수하다. 독일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온 오스트리아(Infineon Austria)는 지난 2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신규 직원을 1000명 채용했다. 또 2022년에만 약 92억 개의 반도체칩을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생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은 2025년까지 약 2억5000만 유로를 투자해 빌라흐 지역에 축구장 10개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다.
2023년 36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한 오스트리아의 반도체 제조업체 아엠에스-오스람(ams-Osram) 역시 EU 반도체법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그라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기업은 본사가 위치한 프렘슈테텐(Premstätten) 지역 반도체 제조공장의 대규모 확장을 예고했다(1800㎡). 2030년까지 투입되는 비용은 총 5억8800만 유로 규모로, 투자금 중 3분의 1(200만 유로)은 유럽 연합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3월 25~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국과 EU의 '제2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와 이와 연계해 진행된 '제1회 반도체 연구자 포럼'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EU의 반도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제3국과의 협력 모색 차원에서 진행됐다. 포럼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양측에서 매년 7억 원씩 반도체 공동연구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뉴로모픽 컴퓨팅(Neuromorphic Computing)과 이종 집적 기술 분야를 주제로 3년간 총 1200만 유로 규모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U 반도체법을 통한 지원을 받게 된 오스트리아 기업 ams-Osram>


[자료: Kleine Zeitung, EU 집행위원회]
2) 교통신호기, 유선전송장치, 전자관부품
수출 호조 상위 5위 이내에 드는 품목 중 세 품목이 MTI코드 2단위로 분류 시 산업용 전자제품, 전자부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해당 부문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먼저, 세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출 금액을 기록한 교통신호기의 경우, 48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2023년 한국의 교통신호기 총수출액 3175만 달러의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기존 한국의 수출 대상국이었던 방글라데시, 이집트에 이어 3위 수출국으로 기록됐다. 관련 수요는 주로 오스트리아의 철도망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스트리아 국영철도(ÖBB)는 현재 오스트리아 내 노후화된 노선을 재개발 중으로, 향후 추가 수요를 기대해볼 수 있다. 수도 빈의 지하철, 버스, 전차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운영 기관인 비너 리니엔(Wiener Linien) 역시 새로운 노선(U5·지하철 5호선)을 신규 건설 중이다. 지하철 5호선(U5)은 추후 지하철 2호선(U2)과 연결될 예정이다. 이 역시 교통신호기 수출 시장 전망을 밝게 한다.
<2021~2023년 교통신호기 대오스트리아 수출 실적>
(단위: US$ 천, %)
순번
코드
품목
2021
2022
202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233
-17.2
2,576
15.4
4,817
87.0
1
814110
교통신호기
2,233
-17.2
2,576
15.4
4,817
87.0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MTI코드 6단위 기준
<오스트리아 국영철도(ÖBB) 및 빈 지하철 공사 모습>


[자료: Kurier, Kleine Zeitung]
네트워크 스위치,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포함하는 유선전송장치의 경우, 수출 금액 413만 달러로, 2022년과 2023년 연속 1755.2%, 249.8%의 높은 수출증감률을 기록했다.
<2021~2023년 유선전송장치 대오스트리아 수출 실적>
(단위: US$ 천, %)
순번
MTI코드
품목
2021
2022
202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64
-96
1,182
1,755.2
4,133
249.8
1
811390
기타유선전송장치
62
-96.1
1,180
1,802.3
4,133
250.4
2
811310
광전송장치
2
382.8
2
15.9
0
-1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MTI 6단위 기준
전자관부품은 2023년 기준 총 650만 달러 수준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는데, 2022년 이후 기존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던 중국,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을 제치고 오스트리아가 1위 수출국으로 올라 눈길을 끈다. 2022년까지 300만 달러대를 유지했던 수출 금액이 2023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1~2023년 한국의 전자관부품 주요 수출국>
(단위: US$ 천, %)
순위
국가명
2021
2022
202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984
117.9
3,131
4.9
6,503
107.7
1
오스트리아
0
0.0
1,405
0.0
4,013
185.7
2
중국
1,058
15.5
1,097
3.6
879
-19.8
3
대만
92
0.0
0
-100
709
-
4
미국
1,136
9195.2
357
-68.6
466
30.7
5
싱가포르
387
39.8
196
-49.2
378
92.2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MTI코드 6단위 기준(기타전자관부품 832490), 순위는 ’23년 수출금액 기준
3) 화장품
화장품 수출은 2021년부터 매년 17.1%, 19.8%, 65.5%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최초로 수출 금액 1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아시아, 미국 등 다른 대륙이나 유럽 주변 국가에 비해 뒤늦게 관심을 받은 경향은 있으나, 현재는 주요 유통 채널에서 한국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현지 최대 규모의 화장품 드럭스토어 체인인 DM과 BIPA에는 다양한 한국산 마스크 제품이 한 섹션을 차지하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진열돼 있다. 프리미엄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퍼퓨머리 부문 1위 기업인 더글라스(Douglas)는 온라인 몰에 K-뷰티 테마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 화장품이 오스트리아에서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 기업에서는 K-뷰티 컨셉의 핵심으로 불리는 단계별 스킨케어, 자연 성분을 사용한 포뮬러의 효과와 그 혁신성을 셀링포인트로 부각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로 수출되는 한국 화장품 품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킨케어와 선크림 등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K-뷰티의 단계별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토너, 세럼, 에센스 등의 기초화장품이 포함된 제품군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22.9%, 67.5%의 수출증감률을 보이며 성장했다. 또한, 자외선 차단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며 한낮에 햇볕을 즐기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선크림은 피부에 자연스럽게 피부에 스며들고, 땀이 나도 끈적이지 않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현지 유통망 바이어들뿐만 아니라 주요 온라인 몰에 게시된 소비자 제품 리뷰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추세에 힘업어 기타화장품 제품군의 경우, 2022년 27.2%, 2023년 50.5% 성장했다.
<2021~2023년 화장품 대오스트리아 수출 실적>
(단위: US$ 천, %)
순위
코드
품목명
2021
2022
202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계
565
17.1
676
19.8
1,120
65.5
1
227320
메이크업, 기초화장품
424
36.0
521
22.9
873
67.5
2
227390
기타화장품
112
-28.2
143
27.2
215
50.5
3
227370
세안용품
13
970.1
3
-79.2
17
508.8
4
227330
두발용 제품
4
66.1
0
-97.6
14
16,049.4
5
227310
향수, 화장수
-
-
-
-
1
-
6
227360
목욕용 제품
12
7.3
10
-17.4
0
-96.7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MTI코드 6단위 기준
<오스트리아 수도 빈 시내 K-뷰티 전문점 및 화장품 편집숍 K-뷰티 섹션>


[자료: 빈 무역관 촬영]
시사점 및 전망
2023년 한국의 대오스트리아 수출 실적 기준, 전년 대비 20% 이상의 증감률, 수출 금액 백만 달러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 2022년 역시 10% 이상의 수출 증가를 기록한 11개의 수출 호조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제품군은 산업용전자제품으로, 교통신호기, 유선전송장치 등의 품목이 꾸준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호조 품목들 중 수출 금액 면에서 단연 우위를 보인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의 경우, 반도체 자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EU와 같은 방향성을 지니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전략과 관련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을 통해 관련 수요의 확대가 기대된다. 이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선전하고 있는 연관 품목 반도체제조장비도 정부와 기업 차원 반도체 드라이브의 수혜 품목으로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첫 수출 100만 달러를 돌파한 화장품은 유럽의 여러 대도시와 같이 현지 K-뷰티 전문점의 수가 늘고 있다. 동시에 주요 화장품 채널을 통해 침투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현지 바이어 기업들의 경우, 한국에서 유행하는 상품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입점을 타진하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SNS를 적극 활용하며 타겟소비자 친화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그 성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Industrie Magazin, Kurier, Kleine Zeitung, dm, BIPA, Douglas, KOTRA 빈무역관 자료 종합(자료 조사: 김성우)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